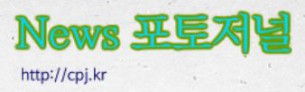건강칼럼 靑松박명윤칼럼(1030)... 치매 머니 154조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포토저널 댓글 0건 작성일 25-07-23 16:16본문
치매 환자 124만명, 치매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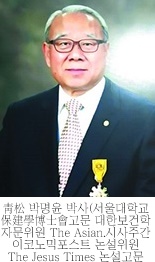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 The Jesus Times 논설고문)
최근 故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조명한 프로가 TV CHOSUN을 통해 방송되었다. 김우중은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도지사를 지낸 아버지(김용하)와 어머니(전인항) 슬하 6남1녀 중 5남으로 1936년 12월 1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부친이 대구사범학교 교장이었다. 1930년대 우리는 대가족으로 5-6명의 자녀를 두었다. 분만(birth)도 대개 집에서 산파(産婆, 조산원, midwife)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출산했다.
김우중은 경기고등학교(52회)와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1963년 섬유수출업체인 한성실업에 근무했던 김우중은 1967년 대도섬유와 손잡고 자본금 500만원으로 직원 5명의 ‘대우실업’을 창립했다. 창업 5년만에 1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김우중은 독보적인 대인관계 능력과 돈이 될만한 무언가를 찾는 상업적 안목, 그리고 근면성으로 대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장남을 교통사고로 잃은 가슴 아픈 가정사도 있다.
승승장구하던 김우중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해외로 잠적했다. 경영비리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 그는 2005년 6월에 5년 8개월 만에 귀국한다. 이후 분식회계 혐의로 약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고, 말년에는 치매로 투병 생활을 했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으로 사랑하는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라고 불렸다고 한다. 김우중 회장은 향년 82세를 일기로 2019년 12월 9일에 별세했다.
‘치매(癡呆) 머니(돈)’란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일컫는 말이다. 주인도 모르는 돈인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치매 증상이 심할 경우 금융 계좌 인출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매매에 제약이 생기는 등 사회 문제가 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치매 머니’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가 2023년 기준 153조5416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5월6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샌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큰돈이 장롱이나 은행 계좌에 방치된 것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면서 치매 머니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124만명에 달했다. 이중 약 62%인 76만명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 1인당 평균 약2억원을 가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전체 인구의 2.4% 수준인데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체 GDP의 6.4%에 달한다. 치매 머니 중 71.5%(113조7959억원)는 본인의 사망과 상속 이전에는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자산이었고, 21.7%(33조3561억원)는 금융 자산이었다.
저출산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매 머니는 2030년 220조원, 2040년 351조원, 2050년 488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50년 488조원은 그해 전체 GDP의 15.6%에 달하는 액수다. 치매 머니는 일종의 ‘숨어 있는 돈’이자 ‘죽은 돈’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 머니는 치매 환자의 판단력이 떨어져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 또한 치매 머니가 자녀 간 다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이 반발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치매 환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일본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이 609조엔이며,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만 126조6000억엔(약 1230조원)이므로 GDP의 약 21%에 달한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상당수가 묶이므로 일본에선 ‘치매 머니’ 탓에 돈이 돌지 않아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일본에선 65세 이상 인구의 10-13%가 치매라고 알려졌다.
일본 고령자의 상당수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대다수는 보유 자산 관리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높은 기대수명(남자 81세, 여자 87세)에 익숙해져 위기감이 덜한 것이다. 본인 말고는 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일본 금융권 원칙에 따라,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엔 은행 계좌가 멈춘다. 가족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
이에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왕래가 거의 없는 독거노인은 치매에 걸리면 은행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병원비나 요양원 입주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에 치매 머니의 리스크(risk, 위험) 해소를 위해선 성년 후견인 제도가 확산돼야 하는데, 아직은 치매 환자의 5%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머니의 동결은 환자 개인의 병원비 문제는 물론이고 막대한 규모 탓에 일본 경제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늘어나는 고령 치매 환자 수와 치매 국가 관리비용은 2022년 93만 5087명(20조8000억원), 2023년 98만 4601명(22조6000억원), 2030년 141만 8600명(38조6000억원), 2040년 226만 3400명(78조2000억원), 2050년 314만 8700명(138조1000억원), 2060년 339만7300명(189조3000억원) 등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보험 가입자도 늘고 있다. 치매보험(癡呆保險)은 임상치매척도(CDR·Clinical Dementia Rating)를 기준으로 치매 진단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금은 진단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다양한 치매·간병 보험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가입 전 특약과 보장금액, 기간, 횟수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CDR에 따른 치매 점수 구분은 ▲무증상(0점), ▲경도인지장애(0.5), ▲경도(1), ▲중증도(2), ▲중증(3), ▲심각(4), ▲말기(5점) 등으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주로 중증 치매를 중심으로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까지 보장하는 삼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검사, 약물 치료비 등 보장 내용도 다양해졌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CDR 3점부터 월 생활비를 지급한다.
최근에는 치매·간병을 한번에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재가센터를 이용할 경우 지원 범위는 하루 3-4시간 정도다. 이에 치매·간병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치매 머니는 땀 흘려 벌어 놓고 써보지도 못하는 돈이다. 이에 무작정 모으고 아낄 게 아니라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장학금, 복지기금 등에도 기부를 하면서 슬기롭게 쓰다 보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누릴 수 있다.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The Jesus Times 논설고문) <청송 박명윤 칼럼(1030) 2025.7.23. Faceboo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